대학교엔 왜 지체장애인이 없을까? 캠퍼스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기자는 대학교 정문에서 강의실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 이유를 몸소 느껴봤다.
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은 보통 학생들에게도 힘겹다. 학교 오르막길의 경사가 심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선 어떨까? 휠체어에 앉아 눈앞의 비탈길을 보자 숨이 턱 막혔다. 몸이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 들고 학교가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졌다. 휠체어를 타고 학교의 높은 경사를 오르기는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이용하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가기까지의 여정도 쉽지 않다. 횡단보도마저 경사져있어 중심 잡으랴, 주변 살피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경사에서 자칫 중심을 잃으면 휠체어는 그대로 차도로 곤두박질 칠 것 같다.
학교 정문을 오가며 일상생활을 할 때는 평범한 횡단보도라고 생각했던 길이 장애인들에겐 큰 불편함과 위험부담이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장애인을 위한 배려 시설은 없었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선 휠체어가 덜컹거렸다. 경사진 보도블록을 지나갈 때는 힘이 두 배로 들었다. 100m도 못 가 팔이 떨어질 듯 저려왔다.

중앙도서관 1층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길게 줄 서 있다. 기다려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걸 느낀다. 학교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광경이라는 듯 신기하게 쳐다본다.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땐 휠체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 사람이 더 타지 못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주변 시선이 불편하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기자가 괜히 위축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땐 학생들이 강의시간이 다 됐는지 우루루 빠져나가기 바빴다. 맨 나중에 남아 혼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는데 문이 닫힌다. 부랴부랴 열림 버튼을 누르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허겁지겁 나왔다.

드디어 20분 만에 중앙도서관 앞 광장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정문에서 걸어오면 7분도 안 되는 거리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강의실이 있는 문화관 건물로 가기 위해선 내리막길을 다시 내려가야 했다. 휠체어를 밀고 가기엔 경사가 너무 가팔라 자칫하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촬영 기자의 도움을 받으며 강의실이 있는 건물까지 도착했다. 학교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지체 장애인 혼자 이동하기엔 높은 턱, 경사진 길, 막다른 길이 되는 계단 등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학교 내 장애인을 위한 배려 시설은 아직 미비하다.

강의실은 건물 3층. 휠체어를 탄 기자가 더 이상 혼자 갈 길은 없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3층 강의실까지 절대 올라갈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야속할 뿐이다.

부산 경성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학생의 생활을 도와주는 ‘하나 도우미’를 매 학기 선발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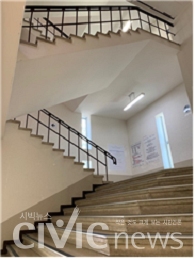
대부분의 대학교에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지만 우선 수강 신청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휠체어 안전교육, 보행 안전 교육, 기숙사 우선 배정 지원 등 장애인 학생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학습 도우미 지원, 교내 이동 지원,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설 공간을 지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학 내에 장애학생의 수가 적으면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도 적을 수밖에 없다. 소수의 장애 학생들은 침묵하며 더욱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교는 부지가 커야 되고, 보다 저렴한 땅값 등의 이유로 대부분 도심보다는 높은 곳에 있거나 산 중턱에 있다. 그렇다 보니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에 가기까지, 일상 곳곳엔 비장애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매일 이런 험난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생존이 걸린 일임을 깨달았다.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벽은 여전히 높다. 비장애인에게는 작은 턱도 장애인에게는 태산 같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몸의 차이로 차별을 겪지 않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


